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https://m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9346938621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인가?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유엔에서 거의 최상위 어젠더로 삼다시피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은 이제 거의 어떤 국가적, 혹은 국제적 프로젝트에도 그 필수적 요소로 포함되어 윤리적 기초나 정당성까지를 담보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국제 프로젝트에는 공여국이 있고 수원국이 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적 수탈을 일삼았던 공여국 그룹에서는 이 지속가능성 요건을 프로젝트에 반드시 끼워넣지만, 이로써 수원국에 부당한 부담을 슬쩍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수용, 이행해야만 했었기에 이 같은 지적이 유추적으로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수원국의 제도와 법규가 과도하게 간섭당하거나 부당한 변형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 이해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반영되어야만 신자유주의의 막후 지배, 전횡, 폭거가 미연에 방지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서는 이른바 "고통분담"이라는 명분 하에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기업만 힘들게 이 위기를 버틸 수 없으니 직원들도 어려움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 고통 전담(전가)라는 비판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즉 CBDR이란 개념은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 처음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환경 위기가 초래된 건 선진국이 여태 약탈적으로 경제개발을 해 온 통에 악화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공업화를 시작해 보려니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수반되고, 갑자기 환경 보호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니 이런 후발주자의 선택과 발전이 제약을 받습니다. 이 점에 CBDR의 위선성, 이중성과 모순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왜 이제와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냐며 불만이 나올 법합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경제굴기를 이루기 전에도 비동맹회의의 주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특히 개도국, 후진국, 남반구에 일정 영향을 행사하려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즉 BRI(Belt- and Road-initiative)를 통해서, 소외된 여러 나라들에 대해 굵직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듯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경쟁이 벌어지다시피하는 작금, 설령 SDGs가 다분히 명목적 구호에 그치는 면이 있다 해도, 선진국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국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의 공영공존에의 길이 열리는 유일한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래의 논의는 이런 SDGs의 논의에 국가나 정부 섹터만 참여할 게 아니라 각종 비정부기구의 발언권도 보장하는, 이른바 multi-stakeholder로 대상을 더 확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공여피로감(donor fatigue)라는 분위기가 퍼지자, SDGs는 이제 MDG로 발전적 개편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개념은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입니다. 올바르게 원조가 쓰였으며, 그 원조가 수원국의 국민들에게 고루 배분되어 실질적인 복리가 과연 증진되었는지가 추상적이지 않게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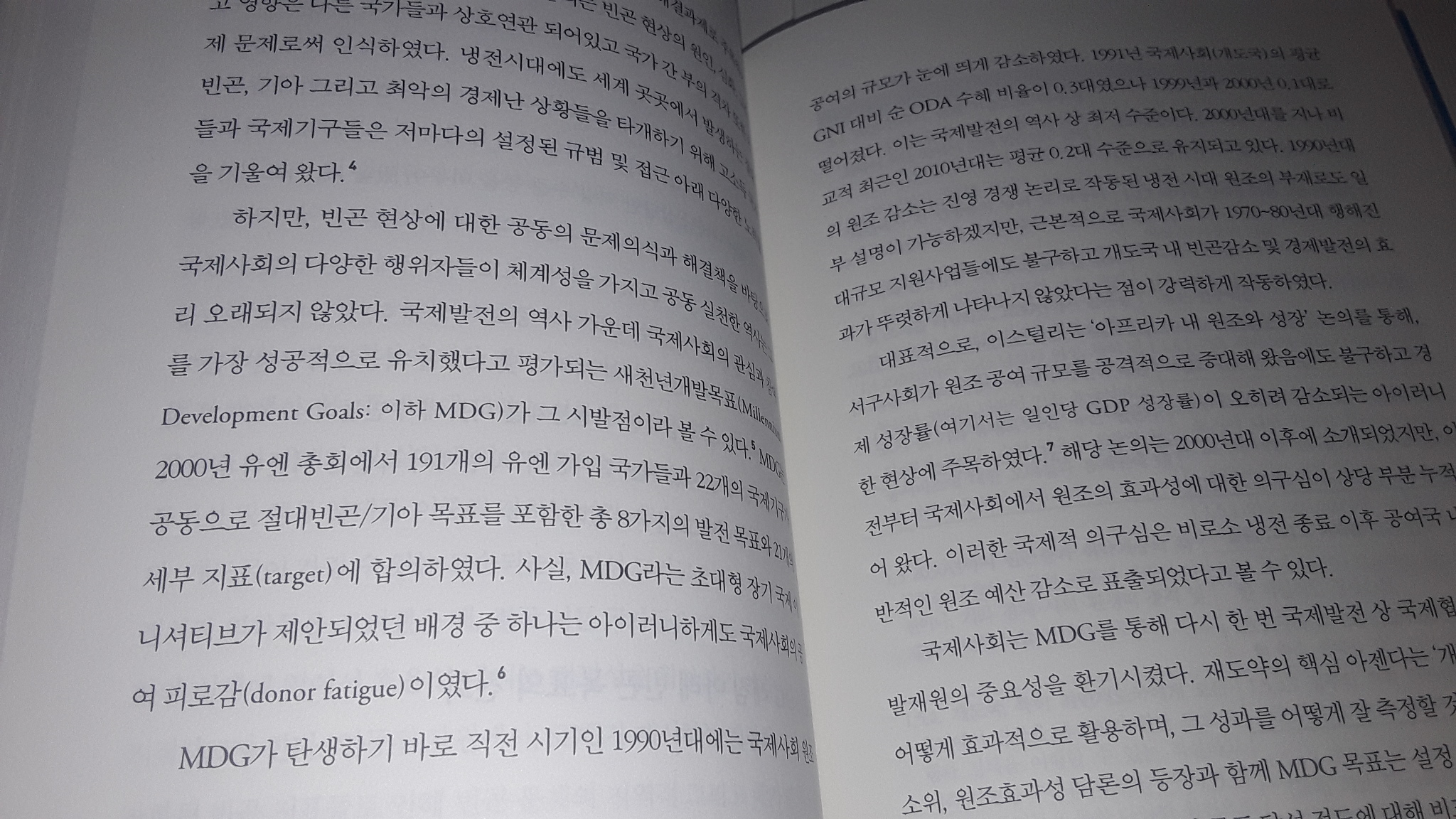
특히 빈곤퇴치에 대해서는 p137의 표에 잘 요약이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SDG의 이상은 난민 수용과 보호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국민감정이나 소요재원 문제, 제도적 미비성 때문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점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재정착이나 보충적 수용은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평등과 과학기술, 보건 이슈 역시 그 우선순위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